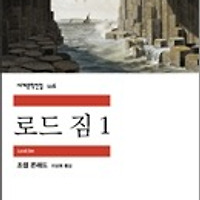21세기 최고의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를 보면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극에 다른 시대인지를 알 수 있다. 바우만이 말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는 갤브레이스의 《불확실성의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갤브레이스는 주로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서 시대의 혼란을 얘기했다면, 바우만은 종합적 차원에서 시대의 혼란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홀로코스트와 현대성》에서 18~19세기의 근대이성이 창출한 전체주의적이고 폭력적인 현대성의 문제를 성찰한 바우만은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를 통해 인류의 현대성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뛰어난 성찰을 보여줬다. 특히 바우만의 상징으로 자리한 《액체근대》는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와 함께 현대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파헤친 탁월한 성찰들로 가득하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수준의 성찰에는 절대 이르지 못한다.
바우만이 현대의 특징으로 액체를 선택했는데 이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격언, "모든 견고한 것들이 녹아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에서 차용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견고한 체제를 구축하며 무섭게 질주하지만, 노동생산성이 발달할수록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 때문에 견고한 체제가 내부로부터 녹아 무너지며, 최후에는 기체처럼 자본주의의 체제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바우만은 이런 마르크스의 주장 중에서 모순과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제거한 채 자본주의라는 견고한 체제가 녹아내려 물처럼 유동하는 상태로 바뀐다고 주장했다. 부정적 세계화가 구축한 전 지구적 시장이란 첨단산업으로부터 1차산업과 소작농 및 물물교환까지 거의 모든 경제 형태가 하나의 액체 덩어리처럼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견고한 체제가 아닌 유동하는 특징이 있는 불확실한 체제의 형태로서.
오늘날의 상황은 선택하고 행동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혐의를 (옳게 혹은 그릇되게) 받고 있는 족쇄와 사슬이 근본적으로 녹아버린 데서 발생했다. 질서의 경색은 인간 주체의 자유가 만든 인공물이자 침전물이다. 이 경색은 '브레이크를 푼' 전반적 결과이며 규제 철폐, 자유화, '유연화', 증가된 유동성, 재정·부동산·노동시장을 풀고 조세 의무를 덜어준 결과이다.
결국 바우만의 성찰도 미국식 신자유주의(무정부적 자유주의) 40년이 장구한 세월 동안 구축돼 왔던 긴밀히 얽혀 있고 상호 이해관계로 단단히 묶여 있던 관계들이 모두 다 무너져버린 데서 출발한다. 공간적 거리를 속도로 극복해버린 전기·전자·정보통신 기술, 제품의 소형화에 성공한 무게 없는 제조업, 거대한 선박을 대체하기 시작한 비행기와 고속열차, 자동차 등의 등장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았던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중후장대한 제조업 중심의 무거운 경제 시대에는 자본과 노동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지만, 자본은 노동이 필요했고, 노동은 자본이 필요했다. 이들은 하나의 틀 안에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거대한 공장을 중심으로 '역사와 자본, 경영과 노동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좋던 싫던 무한한 진보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처럼 결속되어 있어야 했다.
사물인터넷의 세계
하지만 혁신과 향상, 진보를 뜻하는 것이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쉽게 이동 가능한 것들'을 뜻하게 됨에 따라 자본은 더 이상 노동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다. 경박단소한 가벼운 경제가 도래함으로써 20세기까지의 근대성이 현대성으로 변환된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자본은 여행가방에 서류케이스, 휴대폰, 노트북, USB, 현지 법인만 있으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어디로든 가볍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어디를 가든 잠시 머물 수 있고, 필요가 생기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그것은 강제적이고 강박적이고 지속적이고 멈출 수 없는, 영원히 미완에 그치는 '근대화'이다. 창조적 파괴(혹은 이 경우에는 파괴적 창조이기도 한)를 향한, 저항하거나 근절하거나 가라앉힐 수 없는 갈증이다. '새롭고 향상된'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개간'하는 근대성, '해체' '제거' '단계적 폐지' '합병' 혹은 '대규모 감원'의 근대성, 이 모든 것은 미래에도 똑같은 일, 즉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힘이다.
이런 현대성의 목표는 근대성의 목표와 다르지는 않다. 단지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 그 방법론과 존재론이 달라진 것이다. 방법론은 가벼운 경제의 본성인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다. 존재론은 견고한 체제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 끊임없이 유동하면서도, 어떤 견고한 것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액체의 특성을 지닌 체제로 변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우리의 존재 방식과 근대적 형식의 변환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노동의 분업화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든 포디즘과 세계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포스트포디즘의 세계적인 생산체제 분업화가 만들어낸 중후장대한 제조업 중심의 무거운 경제가 막을 내리고, 반도체와 스마트폰, 인터넷과 SNS처럼 경박단소한 가벼운 경제가 도래했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파편화된 대중이라는 고전적 의미를 넘어 소비하는 시민으로서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신자유주의적 개인으로 변질됐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명저와 책이 있는 풍경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죠셉 콘래드의 <어둠의 핵심>의 명문장들 (1) | 2014.07.18 |
|---|---|
| 죠셉 콘래드의 <로드 짐>의 명문장들 (0) | 2014.07.18 |
| 테크노폴리ㅡ고용없는 성장이 인류의 미래라고? (2) | 2014.07.16 |
| 액체근대ㅡ위험의 개인화와 세월호참사 (0) | 2014.07.15 |
| 지혜의 일곱기둥 (0) | 2014.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