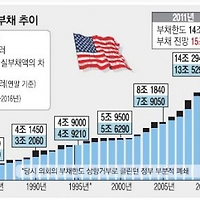오늘 캐치원에서 ‘크로싱오버’라는 영화를 받습니다.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음과 추방, 이별과 정착, 검붉은 희망이 교차하는 이 영화는 아메리칸드림으로 대표되는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슬픈 열망을 담았습니다.
유토피아를 향한 인간의 끈질기고 모진 희구는 죽음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 각종 고통과 비극으로 점철된 인생에서 벗어나려는 인간 해방과 구원의 열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최후의 낙원인 유토피아가 세상과 인생의 비극과 모순들이 만들어낸 이를 수 없는 도피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닌 현재의 미국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메리칸드림으로 대표되는 기회와 축복의 땅이라는 ‘크로싱오버’는 그 이면에 자리한 회색빛 현실로 인해 너무나 척박한 희망과 풍부한 절망과 여밀 수 없는 아픔에 대해 얘기합니다. 영화는 희망으로 포장된 절망의 박스를 채워갑니다.
영화에 나오는 불법체류자들 중에서 퇴색된 유토피아에 정착한 누구도 행복한 시민이 되지 못합니다. 일부에게는 희망의 약속을 열어주지만 거기에도 가혹하거나 영원히 감추어야 할 비극적 대가(가족의 해체와 죽음, 추방, 연인과의 이별 등)가 뒤따랐습니다. 관계는 망가졌고 사랑은 깨졌고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유토피아가 좌절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기술 발전과 국가 간의 차이에 따라 드림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이 땅에서는 아메리칸드림을 모방한 코리안드림이 형성돼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뉴스와 다큐멘터리, 시사교양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고 듣는 코리안드림은 각박한 현실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미생’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전도된 유토피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우상사와 삼성물산을 합쳐놓은 듯한 ‘미생’은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기업의 얘기여서 많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나 그들의 일원이 되고 싶은 유토피아이기도 합니다.
장그래는 '우리 회사'라는 곳에서 선배와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꿈꿉니다. 계약직 사원인 그에게는 정규직으로서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젊은 날의 유토피아적 소망일 것입니다. 그가 정규직에 되던 되지 못하던, 그는 현실적 한계상황에 내몰리면서도 꿈꾸는 권리는 아직 잃지 않고 있습니다. 청춘이라서 아픈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꿈이라도 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지요.
장그래는 경제가 어렵다고, 기업이 힘들어한다고ㅡ누구와 무엇 때문에 경제와 기업이 어려워졌는지 따지지도 않고ㅡ계약직 정규직을 만들어 노동유연화를 활성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의 대기업 사랑은 장그래 같은 수많은 기간제 계약직들을 계약직 정규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수많은 정규직들이 계약직 정규직으로 추락할까요?
삶이란 바로 그 1%의 빌어먹을 희망이 99%의 압도적인 절망을 수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이 숱한 실패와 좌절로 얼룩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성공한 것에서도 우리는 압도적인 절망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의 국면과 이어질 수도 있는 국면과, 그 이전에 그칠 수도 있는 국면에서는.
그렇게 단위가 커갈수록, 시간이 쌓일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능력의 한계에 이를수록 성공의 가능성은 작아지고 줄어들며 퇴색됩니다. 실패의 확률은 정반대로 늘어나고 쌓이고 완고해집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내려놓거나 비워내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적인 현실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명해져가고, 자신과 삶과 타협함으로써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우리는 희망과 성공이 아닌 체념과 절망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인생은 분명 비극입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가끔씩은 행복해지는 비극입니다. 자신과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하지 않으면 이런 지혜도 얻지 못하는 압도적인 비극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에 열려있는 삶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갖고, 그보다 더 갖고, 넘칠 정도로 가져서 세습화된 부의 제국을 구성한들, 그렇게 영속되는 가문의 삶을 이루려고 해도 그들은 인생의 비극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고의 회사에 오른 애플회장 잡스의 때이른 죽음이나,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심근경색(사실상의 죽음)을 떠올려보면 우리는 부의 제국도 절대 유토피아로 이르는 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박근혜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 박근혜와 대통령 박근혜 사이에는 너무나 거대한 간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처럼.
인간이 철학을 잃어버리고, 자본주의와 과학기술 및 계몽의 이성ㅡ이 모두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ㅡ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유토피아를 열망하는 한 우리는 1%의 빌어먹을 희망을 위해 99%의 압도적인 절망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진 게 삶이고, 삶은 일단 낚아챈 먹이는 놓아주는 법이 없으니까요.
헌데 말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매스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류의 삶은 황폐해지고, 관계는 단절되고, 전쟁과 테러는 줄어들지 않고, 직장과 직업은 불안해지거나 단기화되고, 범죄와 이혼이 늘어나고, 불평등과 차별은 강화되고, 가족은 해체되고 결혼은 선택이 됐으며 비혼의 가장들이 늘어났을까요?
현실이 이러함에도 여전히 유토피아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미몽의 종교와 돈과 권력에 휘둘리면서 우리는 해방과 구원을 꿈꾸게 됐을까요? 왜 인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해서 파멸과 종말을 두려워하면서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어디에도 없는 유토피아라는 환상의 세계를 꿈꾸지 않은 적이 없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분명 해방의 역사였는데 우리는 더욱더 현실과 기술의 노예로 전락하게 됐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리로 끌어왔을까요? 어떤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까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빚을 내고, 자연과 자원을 고사와 고갈 직전까지 끌어다 썼으면서도 수십억 명이 절대 빈곤선에서 허덕이고, 기본적 자유과 권리마저도 행사할 수 없는 세상이 됐을까요?
노동의 완전한 종말을 고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열광하며 덜 떨어진 미래학자와 테크노 낙관론자의 장밋빛 전망에 한 가닥 희망을 두는 것일까요?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호모 루덴스의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최저생활에 만족하라는 기본소득에 최후의 희망을 두는 것일까요? 그밖의 다른 미래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쉬운 타협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님에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철학이 있는 공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의 나를 찾아서 (2) | 2016.02.02 |
|---|---|
|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 없다 (9) | 2015.05.12 |
| 민주주의의 위기는 자유의 과잉에서 온다 (3) | 2014.09.16 |
| 변희재의 광기와 벌레들의 역겨움에 대해 (2) | 2014.09.15 |
| 근대이성 이해, 계몽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1 (2) | 2014.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