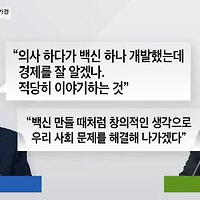모든 국가의 통계가 말해주듯, 가진 것이 많거나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투표율과 정치적 활동이 앞도적으로 높다. 전체 자산의 80~90%를 독점한 상위 1%(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50만 명)가 전체 자산의 10~20%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는 하위 99%(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4950만 명)를 지배하려면 그들을 위해 일하는 정당과 후보가 정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50만 명의 자산이 전체 자산의 90%를 넘어섰다고 하니, 하위 4950만명에게 돌아갈 자산은 무려 50%나 줄어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만원이라 하면 국민총소득은 1500조원이 된다. 이중 1350조원을 50만명이 나눠가지고, 150조를 4950만명이 나눠가진다. 다시 말해 상위 1%에 속하는 50만명은 27억원씩 가질 수 있고 하위 99%에 속하는 4950만 명은 약 300만원씩 가질 수 있다.
27억원 대 300만원, 평균적으로 따질 때 이 정도 차이(26억9700만원)라면, 그리고 그 차이가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면, 상위 1%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잡고 언론을 장악하고 특권의 카르텔을 형성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지 않겠는가? 4950만 명이 300만원보다 더 가지기 위해 150조를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듯이, 50만명도 27억보다 더 가지기 위해 싸운다.
하지만 상위 50만명은 하위 4950만명이 150조원을 나눠갖는 것을 넘어 그들의 몫인 1350조원을 넘본다면 숫적으로 절대 열세인 그들은 싸움을 멈춘 채 그들이 확보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 4950만명의 약탈을 막는다. 그것만이 아니다, 4950만명이 또다시 그런 약탈을 시도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온갖 보호장치를 구축한다,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을 수중에 넣는 것(정부)부터 사설경호원까지.
최상의 방법은 4950만명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약탈 시도를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모조리 잘라버렸고, 4950만명을 최대한 파편화해 각자도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예상태로 만드는데 얼추 성공했다. 이제는 부와 권력, 기회까지 세습할 수 있는 단계만 남았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50만명의 상위 1%가 4950만명의 하위 99%를 지배할 수 있는 최후의 지점에 이른 것이다.
감시사회의 탄생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정보통신과 영상산업 등의 발전으로 4950만명의 일거수일투적(성생활까지)을 감시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위험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 파놉티콘의 구축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어제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이 '음지에서 양지를 지배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국정원으로 하여금 디지털 파놉티콘을 합법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파놉티콘의 특징은 잊혀질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4950만명이 자발적으로 감시에 협조하는데 있다. 필자를 비롯한 하위 99%는 매일같이 모든 시공간에서 디지털 흔적을 남긴다. 다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어제 이후로 달라진 것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든, 자본의 청탁에 의해서든, 국정원에 의해 우리가 남긴 모든 디지털 흔적에 '테러'라는 혐의가 부여됐을 때 어떤 대처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테러를 벌일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분류되고 감시받지 않도록 디지털 흔적을 남길 때마다 '테러 혐의'로 해석될 될 여지가 있는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뿐이다. 그런 자기검열의 한계란 권력(과 자본)의 변덕스러움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 뭐 그쯤이야 총선에서 승리해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면 그만이라고 안심하지는 마시라.
그 이유는 권력(과 자본)의 변덕스러움 때문만이 아니라, 권력을 잡으면 누구나 통치의 수월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력(과 자본)의 변더스러움도 다 그것에서 연원해 나오는 것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종인에게, 모로 가면 서울에 갈 수 없다 (6) | 2016.03.05 |
|---|---|
| 문재인에게, 야당 통합에 노동당과 녹색당도 포함됩니까? (12) | 2016.03.04 |
| 김종인 체제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28) | 2016.03.03 |
| 김종인 체제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11) | 2016.03.02 |
|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총선의제를 바꿀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22) | 2016.03.02 |